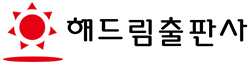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 보리바다
-
 홍도숙
홍도숙 -
 수필집
수필집 -
 2014년 2월 15일
2014년 2월 15일 -
 신국판
신국판 -
 979-11-5634-009-6
979-11-5634-009-6 -
 12,000원
12,000원

본문
저 우주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 쓰인 것
생애에 두 번씩이나 수필집을 묶어 낼 수 있게 한 행운에 가슴 설레며 감사를 드린다.
찬란한 빛의 잎새들이 땅에 떨어져도 저를 밟고 가주기를 애원하는데 나는 다 밟고 가진 못하지만 보이는 모든 잎들을 밟으며 포옹하며 간다.
잎새들은 미처 영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내 글의 형해이기 때문이다.
가을 깊은 바람 부는 장터에서 아무도 사가지 않을지도 모를 내 설익은 열매들을 부끄러워하며, 그래도 장하게 여기며 난전을 편다.
창작의 모진 고통과 희열을 반복하며 빚은 그릇들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유의 파편들을 나는 늙은 도공의 애틋한 가슴으로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며. 대견스러워하며 사바의 창문 밖으로 떠나보낸다.
그러나 이 글들은 지식이나 문자로 쓰인 게 아니라 저 우주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 쓰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감히 생각는다.
불완전하나마 누군가 이 걸 읽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 즐거울 때처럼 시간 밖에서 온전히 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여겨본다.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대면하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월
홍 도 숙
펴내는 글 저 우주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 쓰인 것– 4
작품해설 각시붓꽃 연가 – 2 1 0
명태의 눈
/ 최고의 항해 / – 1 2
/ 각시붓꽃 / – 1 6
/ 갈바람 갈바람 / – 2 0
/ 동고비와 길을 가다 / – 2 4
/ 무서리 내리는 수덕원(修德園)에서/ – 2 8
/ 상수리나무 집 / – 3 2
/ 폐허의 강물 / – 3 6
/ 장어 잡는 날 / – 4 0
/ 우직한 사랑 / – 4 4
/ 그 포구에서 / – 4 8
/ 명태의 눈 / – 5 2
/ 백설무(白雪舞) / – 5 6
환(幻)
/보리 바다/–62
/위대한 사전/–66
/칠우회/–70
/울지 마라 오목눈이/–74
/신탄리의 무우(霧雨)/–78
/단 한명의 청중을 위해서/–82
/무명 시인/–87
/단원(檀園)의 그림 속으로/–91
/류양항(劉洋行)/–95
/은밀한 정원/–99
/환(幻)/–102
하늘 끝에 걸린 초가삼간
/운수 행각(雲水 行脚)/–108
/세포(洗浦)는 포구다/–112
/잣 씨/–116
/내 몸이 봄이 되어/–120
/제7 강의실/–124
/다래의 영토/–129
/하늘 끝에 걸린 초가삼간/–134
/모구리 청년/–138
/콩들의 영광/–142
/마법 같은 삶의 무대/–146
/선재의 ‘대니보이’/–150
/막차로 온 각설이들/–154
열나흘 밤의 새아씨
/종자기 되어서/–160
/메뚜기 사냥/–164
/잃어버린 밀밭/–168
/잠/–173
/열나흘 밤의 새아씨/–177
/목요일의 우정/–181
/작별 인사/–186
/순대/–190
/지팡이를 짚고 잣나무 숲에 서니/–194
/남풍이 불어와/–199
/미치도록 책을 읽다/–203
/올챙이 묵/–207
홍도숙(洪道淑)
1933년 강원도 평강 출생
2004년 동서커피문학상 수상
2005년 《책과 인생》으로 등단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
금 수혜
2007년 수필집 《검불랑 내사랑》 출간
한국산문작가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각시붓꽃
그해 유월 열세 살인 나는 각시붓꽃으로 환생한 엄마를 만나려고 회목리 가는 길섶에 있는 진펄 밭에 매일 나갔다. 뾰족한 붓끝 같은 꽃 몽우리가 아득히 들리는 엄마의 웃음소리 따라 흔들리고 부풀려져 여기저기서 터지느라 바빴다. 환생해서도 엄마는 역시 바쁜 것 같았다.
늪지 가득 각시붓꽃이 군락을 이루고 군데군데 진노랑 원추리꽃도 끼어 있었다. 남빛 치마를 받쳐 입은 엄마가 각시붓꽃 포기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것도 같았다. 엄마는 당신이 각시붓꽃으로 환생해야 나와 자주 만날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다고 믿었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해만 해도 아이들과 어울려서 아무렇게나 메착없이 꺾어간 붓꽃을 엄마는 곱게 간추려서 항아리에 꽂으며 “다음엔 밑동까지 길게 꺾어라.” 하시며 짧은 꽃도 작은 항아리에 알뜰히 꽂았었다.
나는 엄마가 각시붓꽃으로 환생한 것을 믿은 후부터 꽃을 꺾지 않았다. 엄마가 아파할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꺾지 말라고 부탁했다. 꽃을 꺾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항아리에 꽂아 줄 사람도 없었다. 엄마가 없는 집은 불탄 집처럼 황량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엄마가 없는 데도 여전히 아침이 오고, 밤이 들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초록 갈댓잎에 싸인 편편한 반 평쯤 되는 늪지의 바위는 내 방이었다. 바위를 둘러싼 갈대들이 자연스럽게 내 방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어쩌다 잠이 들면 바람을 탄 갈대들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아이들은 집으로 나를 찾아오듯 늪지의 바위로 몰려오곤 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산후조리에 바쁜 물총새 부부의 산실도 보이고, 저만치 꽤 깊은 웅덩이 연못에 띄워놓은 조각배도 보였다. 배는 바람이 자면 저도 함께 졸다가도 바람이 일면 저도 덩달아 빙그르르 돌았다.
늪지 둔덕엔 물총새가 깊이 구멍을 뚫고 둥지를 틀었다. 새 식구를 얻은 부부는 기쁨에 들떠 보이고 코발트색 깃털은 더욱 선명하다. 그런데 그런 물총새가 밉고 징그러울 때가 있다. 파닥거리는 은어나 모래무지의 옆구리를 턱 하니 가로 물고 있는 물총새의 억센 부리가 밉고 눈이 부신 코발트의 날개도 칙칙하고 미웠다.
물속의 먹이를 겨냥하고 공중에 떠서 날갯짓(호버링)을 요란하게 할 때는 난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은 총알같이 입수해서 제 몸만 한 물고기를 노획한 물총새에게 멋진 묘기라며 갈채를 보냈다. 그때는 몰랐던 각시붓꽃의 꽃말이 ‘신비한 사람, 존경’이라는데 아, 틀림없이 각시붓꽃은 엄마의 화신이었다고 믿어진다.
꽃말처럼 엄마는 신비한 사람이었다. 전염병(장티푸스)이 온 마을을 뒤덮었을 때 엄마는 팔을 걷어붙이고 감염된 농장 식구들을 간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쳐 쓰러진 채 소생하지 못했다.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모두 일으켜 주고 자신은 마지막 제물이 되었다.
서른여섯의 엄마는 각시붓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여전사처럼 씩씩했다. 엄마의 생은 신비 그것이었다.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았다. 봄이 오는 삼월에 엄마를 보낸 뒤 농장 식구들은 넋을 잃고 손을 놓은 채 일을 할 수 없었다.
우린 모두 실낙원의 떠돌이별이 되었다. 슬픈 유성우(流星雨)처럼 어느 땅 위로든 떠내려가야 한다. 정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갈 때마다 각시붓꽃은 오열하며 몽우리를 터뜨렸다. 야생의 여름 꽃으로 환생한 엄마는 가여웠다. 온몸으로 웃고 울며 오열해도 품어줄 수도 쓰다듬어 줄 수도 없다.
그해 늪지에서의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면회였다. 같은 해 팔월에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십일월에 엄마의 무덤을 두고 환생한 각시붓꽃을 두고 고향 검불랑(劒拂浪)을 떠나왔으니까.
어려서 엄마의 환생을 믿은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당신과의 재회를 믿는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용렬한 내가 요만큼이라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한 것은 엄마로 인한 것이고, 요만큼이라도 마음을 선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고작 십삼 년의 인연뿐이였지만, 백 년보다 깊고 깊은 사랑을 품어 안는다.
*3. 환(幻)의 문학
그 요나콤플렉스를 향한 연가가 홍도숙 수필의 요람인데 이를 작가는 <환(幻)>에서 적나라하게 묘파해준다. 열셋 어린 나이, “여린 대나무의 첫 번째 매듭처럼 엉성하고 철없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형상들은 눈부시고 경이로웠다. 그렇게 신비의 세상으로 발돋움하려는 나를 두고 어머니는 떠나갔다.”는 환의 세계.
나에게 창작이란 행위는 그 자체가 환이다. 애초 환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뚜렷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생명의 유무를 가려 실체와 실체가 아닌 것으로 구분 지을 수도 없다. 순간에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헤서 헛것이라고 말할 수는 더욱 없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이던가. 얼마나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던가. 한시적인 생명이던가. <환(幻)>
“환! 그것은 어디든 내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지친 나에게 현현(顯現)되는 은밀한 사랑의 표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환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내 긴 이야기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므로”라는이 작가. 그 환의 밑둥치는 어김없는 요나콤플렉스고 그걸 찾고자 “절망하면서도, 지치고 외로워하면서도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한다.”(<무명시인>).
그 우주 사랑의 문학적 경지를 작가는 “《백이전(伯夷傳)》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독서광 둔재시인 김득신(金得臣)”의 일화에서 찾는다. 그는 “바람 부는 가지에 새의 꿈이 어지럽고”라는 댓구를 잇지 못해 고심 중이었다.
_임헌영 작품해설 ‘각시붓꽃 연가’ 중에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