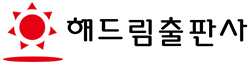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 그땐 그랬지
-
 이진영
이진영 -
 수필in
수필in -
 2021년 11월 22일
2021년 11월 22일 -
 변형신국판
변형신국판 -
 979-11-976282-1-4
979-11-976282-1-4 -
 15,000원
15,000원





본문
늘 시골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지요. 시골에 외갓집이나 친척 집도 없었으니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글에 담고 싶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내려오는 장독들이 즐비하고, 맷돌이나 다듬잇돌 돌절구 등이 있는 뒤뜰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언니들과 그 뜰에서 널을 뛰었고, 앞마당 은행나무 가지에 매어놓은 그네를 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봄가을 어머니가 홍두깨에 천을 감아서 다듬이질하는 소리를 듣고, 모시옷을 손질하는 어머니 곁에서 그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솜을 틀어서 포근한 이불을 꾸몄던 그 가을날도 가슴 속에 차곡차곡 개켜 놓았습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사라져버린 것이 많은 오늘, 정겨웠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그리운 추억을, 그 시간 속에 머물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중한 풍습이나 옛것들을 통해 오늘을 돌아볼 수 있게요. 좋은 어제가 있었기에 더 좋은 오늘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내 그 시절이 가슴 짠하게 그리워졌습니다. 한 세상 힘들게 살아왔을 나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기억을 통한 위로와 기쁨을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선물하려 합니다.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책을 내면서 … 4
1. 움직이는 돌
김칫돌 13
움직이는 돌 19
다듬이질 24
널뛰기 30
그네타기 37
면포 부인(綿布 婦人) 42
어머니의 버선본 47
문지방을 넘으며 52
2. 조각보를 모으다
여름날 59
모기장 65
나무 도마(널 잊었어) 70
종소리 75
조각보를 모으다 80
겨울 빨랫줄 84
솜이불 88
장독대 94
3. 식혜를 마시며
쉰밥 101
밥 한 그릇 108
김장 113
식혜를 마시며 119
고추장 124
밥 짓기 128
잔치 국수 132
떡 맛 137
4. 외줄 타기
외줄 타기 145
윷놀이 150
어떤 그릇을 말한다(놋그릇) 156
박씨 물고 온 제비 161
빨래 166
행복한 빨래 171
장작불 176
오래된 우물 180
호, 설리(雪里)
서울에서 출생하여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창작수필] 수필 등단 [문학시대] 시로 등단했습니다.
극동방송 ‘참 좋은 내 친구’에서 칼럼 방송
[주간기독교]에서 신앙에세이 연재했습니다.
군포시주최 ‘전국전통문화 작품전’ 대상 수상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동화부분 최우수상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시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필과 동화, 시를 쓰고 그 시를 춤추게 하는 낭송을 하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힘든 세상 여행길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수필집: [내 안의 용연향] [나도 춤추고 싶다] [하늘에 걸린
발자국] [종이피아노] [10초] [그땐 그랬지]
동화집: [초록우산의 비밀]
시집: [우주정거장 별다방] [내 슬픔도 먼지였다]
오래된 우물
집을 나서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가면 좁다란 골목이 나온다. 그 안쪽에 깊은 우물이 있는 집이 있었다. 그때는 수도가 없는 집도 많았지만, 있는 집도 단수가 잦았다. 그래도 흔치 않았던 우물은 어린 나에게 신기로움이었다.
가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양동이 두 개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갔다. 유난히 깊어 물맛이 좋기에 어머니가 몇 해째 장을 담그기 위해 물을 길어오던 곳이기도 했다. 또 동네 아줌마들이 심심치 않게 모여들어 물을 긷고 푸성귀를 씻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던 곳이었다. 처음에는 골목 한쪽에 있던 우물을 담장을 넓히면서 자신의 뜰에 가두어 놓은 집주인은 문을 항상 열어 놓겠노라고 약속했었단다.
차돌 듬성듬성 쌓아 올린 우물가에서, 좁고 깊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했다. 물결 출렁이지 않아 아직 이지러지지 않은 우물 속에는 맑은 물처럼 눈매 서늘한 내가 있었다.
잔잔한 하늘도 담겨 있었다.
두레박이 한없이 내려가면서 철~석 철~석 물과 마주치는 소리가 음악처럼 귀를 울렸다. 말갛고 동그랗게 비쳐 보이던 우물 속 하늘이 이내 얼굴을 찡그리고 내 모습 또한 찡그려진 우물 안을 또 들여다보았다. 두레박은 좁다란 우물 안 돌들에 이리저리 몸을 부딪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커~어! 두레박에 넘실거리는 물을 벌떡 들이켜는 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물 한 모금을 마셔 보았다. 소독 냄새나는 수돗물에 익숙해져 있는 내게 찝찝한 우물물 맛은 낯설었다. 그런데 그 물맛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입안에 남아 맴돌았다. “앞니 빠진 중강새 우물 앞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란다. 오빠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려대서인지 앞니가 빠진 뒤에는 우물가에 가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니 슬며시 웃음이 번진다.
어머니는 물을 길어 쌀을 씻고 양동이 가득 물을 채웠다. 두 양동이만큼 물을 길었는데도, 내어준 자국을 내색하지 않는 우물은 여전히 그만큼의 깊이로 그만큼의 물을 안고 있었다. 출렁거림이 잦아든 우물 안에는 여전히 잔잔한 내 모습이 있었고 잔잔한 하늘도 잠겨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가끔 그 우물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을 길으러 가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좀처럼 단수가 되지 않았고 설혹 단수된다 한들 미리 받아 놓은 물이 있어서 우물까지 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끔 맛살이며 조갯살을 팔러 오던 행상 아줌마가 전해준 이야기는, 집주인 남자가 첩살림 차리느라 빚에 몰려서 우물에 빠져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아니, 마누라와 빚 독촉하러 온 이들 앞에서 엄포로 빠지겠다고 했다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 미처 손 쓸 수도 없이 빠졌다고도 했다. 아쉽게도 우물은 이내 메워져 버렸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아득히 사라졌다.
모두의 우물을 뜰 안에 가두어 놓고 문을 열어 놓겠다고 약속했던 주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모두의 우물을 자신만의 우물로 차지하려던 욕심이 지나쳐서인가, 홀로 끌어안고 가버렸으니.
그 후 살던 동네에서 이사했고, 그 오래된 우물도 잊혀졌다. 그러나 남다르게 연약한 몸으로 한세상 살아오면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 속 갈증을 풀기 위해서인지, 가끔 그 아득한 기억 속 우물가를 서성이곤 했다.
흡사 제 탓이라고 제 가슴 치듯이, 탕! 탕! 두레박 천천히 내려가면서 좁은 우물 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아픈 소리를 듣는다. 늘 높고 순수한 세상만을 목타게 원했던 탓에 연이어 맑은 물을 길어 올리려 했는가 보다. 힘겨운 몸짓이 만들어낸 시퍼런 멍이 이끼가 되어 둘 틈 사이에 숨죽이고 있었다. 꼭 그만큼의 하늘만을 안고도 만족하며, 퍼내어도 다시 고이는 정 뿌리치지 못한 채 속울음 삼켰을 애달픈 사랑을 들여다본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 이제야 우물의 깊은 속내를 품었는가. 어느결에 내 가슴 한복판에도 습윤한 기색이 아릿하게 퍼져나가니……. 가실 새 없이 검푸른 멍, 안으로만 머금었을 한 맺힌 가슴팍을 쓸어본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