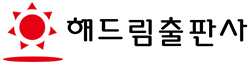자유글 불루베리 스무디처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래여 댓글 2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9-06 09:24본문
불루베리 스무디처럼
박래여
새벽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농부는 감산에 풀치러 갔다. 안개가 걷히면 뜨겁겠다. 일찍 잠을 깼으니 뭔가 해야 한다. ‘고추 따지 마라. 내가 와서 딴다.’ 엄포를 놓고 가는 농부에게 ‘그럼 나는 살만 찌워 잡아먹을래?’ 응수했다. 고추 골에 들어섰다. 숨어있던 모기와 하루살이가 우왕좌왕하며 달려든다. 붉게 익은 고추는 주렁주렁한데. 고추 한 그루에 탄저병이 왔다. ‘겨우 첫물 따는데 병이 들면 어쩌나? 너희들 좀 건강해라.’ 한 달이 넘게 비가 왔으니 약도 안 치는 고추가 병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밥 끓는 냄새가 나고 농부가 왔다. 탄저병 든 고추나무를 알려줬다. 농부는 과감하게 고추포기를 뽑아낸다. 주렁주렁 달린 풋고추가 아깝다. 고춧잎은 나물로 먹어도 되는데. 이러다간 우리 양념할 것도 못 건지겠다. 고추농가는 약 통을 지고 산다는 말이 있다. 약 안 치고 되는 농작물이 없다지만 가능하면 약 안 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길 바란다. 내 손으로 직접 농사지어 거둔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게 된 세상이 불편한 거다.
우리 고장도 논밭이 자꾸 사라진다. 너른 논이 메워져 건물만 늘어난다. 농민도 귀해진다. 이러다 식량부족이 오지 싶다. ‘저 옥토가 다 없어졌네.’ 읍내 주변의 너른 들이 사라져간다. 인구수는 자꾸 주는데 건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농사꾼은 늙어가고 농토는 묵정이가 되었다가 건물이 들어선다. 우리도 농사를 거의 접었다. 힘이 달리니 하는 수 없다. 농사를 대물림하려는 자식도 귀하다. 세상은 어떻게 될까. 가진 자는 이런 정황을 알기나 할까. 돈만 있으면 비싸고 좋은 외국 농산물을 직수입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않을까.
붉은 고추 한 바구니를 땄다. 농부가 거든다. ‘씻어서 그늘에 늘어야해.’ 수도꼭지 앞에 함지를 놓고 고추를 씻었다. ‘꼭 씻어야 하나? 약도 안 치는데.’ 농부가 묻는다. ‘봐봐 고추 씻은 물이 더럽잖아.’ 나는 생색을 낸다. ‘저리 비키라. 내가 하꺼마.’ 마무리는 농부가 맡았다. 그늘지는 평상에 널어놓고 검은 망으로 덮었다. 이삼일 시들시들 말렸다가 널면 된다. 뜨거운 햇볕에 바로 널면 고추가 익어 희나리가 될 수 있다. 며칠은 검은 망을 씌워서 말리다가 고추가 꾸들꾸들 해지면 햇볕에 바로 펴널어도 된다.
햇살이 나서 좋다. 이불을 빨아 넌다. 골짝물이 철철 넘치니 빨래하기 좋다. 왜 나는 햇볕만 좋으면 빨래를 해서 널고 싶을까. 힘에 부쳐 씩씩대면서도 깨끗하게 빤 빨래를 빨랫줄에 걸어놓고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 자꾸 우울증이 온다. 건강검진 결과에도 우울증 증상이 있단다. 우울한 생각을 접고 싶은데도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 예순 일곱이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90살 고은 선생은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데. 세상에 태어나 남기고 갈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남매의 방 앞에 에어컨을 걸었다. 에어컨 센터 기사를 불러 시댁에 걸렸던 것을 떼어 왔다. 이승 떠날 때는 아무리 소중한 것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두 어른의 생신이 한여름이었다. 형제자매들 모일 때면 에어컨은 효자노릇을 했다. 두 어른이 없는 집은 낡아가는 중이다. 언젠가 남의 집이 될 시댁이다. 처음 계획은 시댁 집을 깨끗하게 꾸며 형제자매들 오면 편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었다. 이런 저런 잡음이 들리면서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팔아서 나누어주자고 했다. 지금은 그런 마음까지 싹 지우고 싶다.
형제자매도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이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모이기 어렵다. 고향에 오면 빈 집으로 남은 시댁에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올지 모르나 거부하고 싶다. 나는 언제까지 시댁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 내 몸이 천근이라 손님 대접하는 것도 버겁다. 각자도생이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 삼십 수년을 많이도 챙겼다. 친인척 누구에게나 독하게 군 적 없다. 반기고 나누어주면서 살았다. 막상 내가 노인이 되고 환자가 되니 모든 것이 버겁다. ‘내 업이구나. 한없이 베풀어야 하는 업이구나.’ 자각 할 때가 많다.
수영장에 갔다. 만날 때마다 내게 차 한 잔 사 주고 싶다는 형님에게 끌려 불루베리 스무디를 먹었다. 연한 핑크빛 차가운 음료가 속까지 얼리는 것 같다. 오고가는 것이 정이고 부드러운 말 한 마디가 정인 사람들, 이웃에 사는 그들이 핏줄로 맺은 형제자매보다 가깝게 느껴진다. 나도 내 가족 모두에게 불루베리 스무디처럼 예쁜 정을 주고 싶은데 왜 자꾸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들릴까. 형제자매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자꾸 강해질까. 병원에 누워계신 갓난쟁이 노모를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멍울이 생기고 편치 않다.
2023. 7.
댓글목록
한판암님의 댓글
한판암 작성일박래여님의 댓글의 댓글
박래여 작성일
선생님 연세에 예취기 메고 벌초는 할 수 없겠지요.
젊은 조카들 고생하는 것 지켜보시다가 밥 한 끼, 막걸리 한 잔이라도 사 주시면 그게 정이겠지요.
일꾼 부려 벌초해도 벌초비조차 만만찮습니다.
젊은 농꾼이 귀해서 그렇지 싶어요.^^
건강 단디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