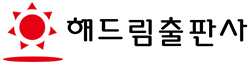수필 9월의 새벽, 편집장에서 부사장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드림출판사 댓글 1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9-08 15:44본문
어쩔 수 없다. 단 한 번도 64세인 내가 노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늙어간다. 밤이면 잠을 자다 두어 번 깨서 작은 볼일을 본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80세 가까이 산 고려말 우탁의 탄로가(歎老歌)이다. 최초 우리 말 시조로도 알려졌다. 어디서 꼬였는지 나는 여태 이 시조의 ‘가시’를 ‘쇠스랑’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면 다른 시조와 착각을 하였던지…. 여하튼 600여 년 전 한 세상을 살았던 이의 탄식이지만 세월에는 역시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쇠스랑으로 막아도 피할 수 없이 늙어가는 길. 하지만 쉽사리 늙지 못하는 게 있다.
새벽 3시, 마당에서 조각달을 보았다. 둥근달 한 조각이 빼꼼히 드러나 있지만, 보름달 빛이 한쪽으로 모두 빠져나오려는 듯 유난히 밝다. 조각달 주변에는 별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다. 별들을 가만히 올려다본다. 누가 별들을 반짝거린다고 하였을까. 작은 별들은 연신 깜박거리거나 가물거린다. 제법 큰 별들은 영롱하게 빛날 뿐이다. 깜박거리거나 가물거리는 별들은 곧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하늘에는 별들이, 사방 풀숲에는 풀벌레들이 서로 말갛게 그리워하며 울어쌓는다. ‘이런 새벽 풍경도 감상 못 하는 인간들이 저들 잘났다고 까불어 쌓는다.’라며 마당을 서성거릴 때, 옆집 닭장에서 홰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마을 여기저기서 수탉이 울어대며 가물거리거나 깜박거리던 별들을 모두 쫓아버린다. 어느새 조각달은 새벽 운명을 함께할 두어 개 별들만 거느린 채 사위어 간다. 9월의 새벽 3시, 한창 남았을 잠을 확 깨워버리는 시골 풍경이다. 또한, 나의 늙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남은 잠을 버린 채 새벽을 배회하다 보니, 오늘이 64세 생일이구나 깨닫는다. 며칠 전 시골로 내려온 아우에게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기 위해 국거리 쇠고기를 사면서 여분으로 샀던 것을 냉장고 냉동실에 두었던 것이 떠올랐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실로 내려가 있다. 아마, 지난 밤 어머니가 냉장실로 꺼내두신 모양이다.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릴 생각이었지만 91세 어머니가 64세 아들의 생일 미역국을 끓이려 미리 해동시켜 두신 듯하다. 갈치 몇 토막도 함께 들어 있다. 요즘 91세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달고 산다. 어머니가 끓여주실 미역국도 내가 어머니에게 받아먹는 마지막 미역국이 될까 싶어 몹시 우울해진다. 내년도, 내후년도, 그다음 해도 또 그다음 해도 어머니와 함께하길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랄 뿐이다.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와 메시지를 보냈다.
생일 축하해.
몸도 마음도 노인으로 살지 말고 늘 청년으로 살자.
내가 없는 회사 빈자리 메우느라 애써 주어 고맙고
그 덕분에 내가 어머니를 살피며 생활할 수 있어서 고마워.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늘 건강 유지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 번
운명적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나와 생년월일이 같은 편집장에게 보낸 메시지다. 16년째 편집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바닥에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애써왔다. 명성은 쌓지 못하였으나 가슴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함께한 세월이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회사일지라도, 내가 서울 사무실을 비운 채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편집장이라는 직함이 모든 거래처며 저자들을 대하기에는 격이 낮은 듯싶어 부사장으로 직급을 올렸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오르겠으나 봉급은 올려줄 처지가 못 되니 생일 선물도 못 되지 싶다. 직급이 오른다는 것은 회사에서 쫓겨날 때가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으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며’라고 하다가 ‘어머니를 살피며’라고 적었다. 보살피다와 살피다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어머니를 보살피며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머니를 살피며 함께 살고 있을 뿐이다. 나는 91세 어머니를 살피며 살고, 어머니는 64세 아들을 보살피며 사는 것이다. 저녁 시간이라도 어머니와 오붓하게 지내고 싶으나 하필 오늘 순천문학 모임이 있는 날이다. 더구나 서울에서 노 소설가가 내려오신다니 빠질 수가 없다.
어머니가 서운해하면 어쩌나 싶다.
댓글목록
한판암님의 댓글
한판암 작성일우선 "편집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에게 축하드리며, " 64세 아들은 91세 어머니를 살피며 살고, 91세 어머니는 64세 아들을 보살피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64세 아들의 효성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생일 아울러 축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