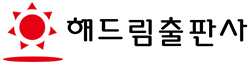수필 엄마를 보내드리던 날/임영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드림출판사 댓글 2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0-12-09 11:12본문
엄마를 보내드리던 날
엄마가 이승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 특별하게 아픈 곳은 없으셨지만 내 집에 오실 때마다 유언처럼 한마디씩 하셨다.
그날도 부스러질 것 같은 몸을 의지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집에 오셨다. 한 줌도 안 되는 몸을 카펫에 누이시며 ‘아가! 어미가 죽을 때 꼭 입고 싶은 옷이 있구나. 미색 한복 있잖니. 거기에 옥색 덧저고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입혀다오. 만약 어미가 세상을 뜰 것 같다는 소식을 듣걸랑 제일 먼저 네 올케에게 그 옷을 입혀 주라고 이야기해 주어라.’라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살아오신 세월을 얼마나 강단지게 사셨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게 우리 집에 다녀가신 3일 후 새벽이었다.
희뿌옇게 열리는 새벽에 오빠의 전화를 받고 엄마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나절이 지나도록 엄마가 계신 곳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울고불고 제일 먼저 뛰어가야 하는 나는 고요하고 담담했다.
중간, 중간 전화로 확인하는 여유까지 부렸으니 지금 생각하면 이런 불효가 또 있을까 싶다. 오후가 되어서야 남편과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엄마 의식은 가물가물하셨다. ‘엄마! 저 왔어요.’라며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얼굴을 매만졌다. 꺼져가는 의식을 잠시 차리셨는지 내 손을 잡으셨다. 가늘게 떨리던 입술이 ‘그래 우리 딸 왔구나. 널 보지 못하고 가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난 울 수가 없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엄마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시겠지만, 마음에 머리에 살아 계심을 믿었기에 절대 울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오빠가 도착했고, 복 많으신 엄마는 칠 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고운 얼굴에 잡혔던 주름살도 없어지고, 군데군데 자리 잡았던 검버섯도 사라진 얼굴은 천사 같았다. 아가 피부처럼 보드라운 살결의 엄마가 작은 내 손에 만져졌다. ‘엄마!’ 다시는 볼 수 없었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이 엄마를 사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엄마는 떠나셨다.
문상객이 모여들고, 한결같이 복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엄마가 본향으로 돌아가신 날은 음력 동짓달 초나흘이었다. 꽁꽁 얼어붙을 동지섣달인데 봄날처럼 따뜻한 햇볕이 내렸었다. 살아계실 때처럼 포근하고 인자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였다.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복 받으신 분이시구나.’ 태어남보다 죽음을 잘 맞이해야 한다는 말을 늘 들었었다. 엄마의 삶은 어렵고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돌아가시는 날은 복을 받아 가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편찮으시지 않고, 앓아누워 자식들 힘들게도 하지 않으셨고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이젠 간다.’시며 떠나신 엄마가 애처롭고 아픈 날이었다.
포슬포슬한 구덩이가 팼다. 엄마의 한평생이 이제 저 구덩이 속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겠구나. 꽃상여를 타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북을 두드리며 선창하는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처럼 들렸다. 구슬픈 일생이 북소리와 함께 낮은 산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막내 오빠 손을 잡고 엄마 무덤에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밟고 또 밟아 드렸다. 내가 살아서 엄마를 묻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엄마 가신 길에 더 좋은 빛으로 비춰 달라고 기도했다. 엄마가 누웠던 그 집에 들어서니, 가슴 한쪽이 아프다. ‘이제! 엄마는 안 계시는구나. 다시는 볼 수 없는 우리 엄마!’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엄마 묻은 산을 멀리하고 돌아오던 새벽, 안개가 자욱하여 음침하고 무섭던 고속도로에서 엄마는 내가 탄 자동차 옆에 흩날리는 안개를 맞으며 걸으셨다.
‘그렇구나! 엄마는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었구나.’
댓글목록
한판암님의 댓글
한판암 작성일어먼님의 마지작 길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웅하셨으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6남매의 외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친 모두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 여태까지 불효를 한 것 같은 자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답니다. 오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말입니다. 어쨋던 저승으로 떠나신 모든 어른들 그곳에서는 평온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빌어 봅니다. 어린애처럼 갑자기 이승을 버리신 그분들이 보고싶어 울컥한 지금입니다.
박래여님의 댓글
박래여 작성일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를 생각합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요. 이젠 잊어질만도 한데
뜬금없이 엄마를 부르고 싶을 때 있습니다.
영숙 샘, 건강 단디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