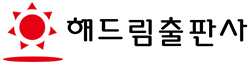수필 정지용문학관을 다녀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판암 댓글 1건 조회 895회 작성일 21-11-30 08:00본문
정지용문학관을 다녀와서
소설(小雪) 하루 전인 어제 일요일에 충북 옥천(沃川)의 정지용문학관을 다녀왔다. 이웃인 이원에서 중학교를 다녔으며 그동안 수 십 차례 옥천읍을 오갔음에도 정작 문학관에 들릴 기회가 없었다. 하기야 6.25라는 민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의 격랑을 헤쳐 나가던 모진 세월에 어떤 이유였던 월북 인사로 분류되어 수면 밑에 묻혀 있다가 1988년 납북으로 판명되었던 우여곡절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진작 찾아보리라는 생각을 해왔건만 연(緣)의 끈이 쉽게 이어지지 않아 어제서야 어렵사리 기회를 포착해 소원을 이뤘다.
한적한 옥천의 구읍(舊邑) 작은 냇가 골목에 자리한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은 상상 이상으로 옹골찼다. 길거리 담 벽엔 “향수(鄕愁)”를 연상케 하는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고 문학축제를 연상시킬 정도로 여기저기에 시화(詩畫)가 즐비하게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생각보다 너른 주차장이 두 군데나 마련되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푸근하게 다가와 나그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다.
문학관으로 향하다가 왼쪽에 자리한 ‘정지용 생가’로 먼저 발길을 옮겼다. 사립문을 향해 걷는데 작은 도랑을 건너야 했다. 그런데 그 도랑 위에 거대한 널빤지(폭 1.5m이고 길이 4m 정도) 같은 검은 돌이 상판(上板)으로 놓여있었는데 이를 ‘청석교’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길 옆에 별도의 오석(烏石)에 새져진 사연을 살피니 이랬다. “청석교 상판인 돌은 일제 강점기 시인의 모교인 죽향초등학교에 ‘황국신민서사비’로서 비문(碑文)이 새겨져 있었단다. 그런데 광복 후에 그 비문을 갈아내고 ‘통일탑’으로 이름을 바꿔 세웠다. 그러다가 1994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상판으로 쓰이고 있다”는 안내였다. 비록 무생물로서 하찮은 바위일지라도 서러운 질곡의 세월에 상처를 켜켜이 새긴 역사의 증좌라고 자리매김하니 뭇생각이 밀려와 심란했다.
원래의 ‘정지용 생가’는 언젠가 수재(水災)를 겪으며 완전히 유실된 자리에 복원된 초가였다. 조붓한 대지위에 안채와 바깥채로 복원되었다. 전문적인 시각이 아닌 청맹과니 눈에 안채는 부엌과 아랫방과 윗방 구조였다. 한편 안채와 마주보는 바깥채 역시 3칸(間) 건물로 양쪽에 세간이나 곡식 따위를 넣어두는 곳간 같은 광이 하나씩 있고 가운데는 농기구나 허드레 물건의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특이 할 게 없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때마침 초가지붕에 새로운 이엉*을 잇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방문을 꼭꼭 닫아 내부는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래도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적어도 7~8년 정도 지붕 위에 매년 새로운 이엉을 얹었기 때문에 지붕의 두께가 1m 가깝지 싶었다.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詩語)로 우리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학창시절 그 주옥같은 시를 대했던 적이 없다. 그것은 월북인사로 자리매김 되어 멀리했던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연이 촘촘하게 얽혀지면서 자연스레 작품에 심취하기도 했었다.
문학관에 들어서며 오른편에 걸려있는 ‘호수’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편 왼편에 ‘향수(鄕愁)’가 세로쓰기 붓글씨로 그 옛날 표기법 그대로 씌여져 걸려 있었다. 이 시를 가요로 만든 곡을 가수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 교수가 듀엣(duet)으로 부르며 더욱 유명해졌지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시이다.
문학관을 한 바퀴 돌며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작품인 때문에 요즘 맞춤법이나 표기법과 상당히 많이 달라 고전(古典)을 대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또한 예사롭지 않은 시적 자아와 자연과 일체감을 통해 고향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줄대는’, ‘해설피’, ‘풀섶’, ‘함초름’ 따위의 시어 선택은 우리말의 아름다움 일깨워 주고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은 아련한 고향의 모습을 소환한다는 맥락 때문이다. 한편 각 연(聯)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후렴구는 시각 및 청각적인 자극을 유도하며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탁월한 발상으로 여겨졌다.
북한에서 몰(沒)한 해를 특정할 수 없지만 대략 50년 안팎이 선생의 일생이다. 게다가 북한에 있을 때 작품은 깜깜한 상태이다. 현재 전해지는 시집으로 정지용시집(鄭芝溶詩集 : 시문학사, 1935), 백록담(白鹿潭 : 문장사, 1941), 지용시선(芝溶詩選 : 을유문화사, 1946) 등이 있단다. 그리고 산문집으로 문학독본(文學讀本 : 박문서관, 1948)과 산문(散文 : 동지사, 1949)이 전해진다. 한편 앞의 간행본에 실리지 않은 시와 산문들을 모아 정지용전집(鄭芝溶全集 : 민음사, 1988)이 시와 산문으로 나뉘어 2권으로 발간되었다.
금강과 대청호 때문에 민물고기가 많이 잡힌 때문일 게다. 점심은 문학관에서 약간 떨어진 민물고기 전문점에서 어탕국수*와 도리뱅뱅*을 먹었는데 매우 인상적이고 감칠맛이 있었다. 한편 저녁은 문학관 인근에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 호박꼬지*찌개를 먹었는데 맛이 일품이고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내는 숨겨진 맛 집이었다. 여덟이 식사를 했는데 모두가 호박꼬지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많이 먹던 호박꼬지를 왜 다를 모르는 걸까?
거의 하루 종일 문학관 주위를 맴돌다가 해가 설핏해질 무렵에 대청호가 만들어지며 생겨난 관광지로 ‘옥천 9경’중에 하나라는 ‘장계관광지’를 대충 둘러보고 다시 문학관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니 노루 꼬리만큼 남았던 해가 서산마루를 넘어가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귀갓길을 서둘렀다. 옥천에서 6시쯤에 출발하려는데 벌써 사위가 점점 어둑어둑했다. 길눈이 밝은 B회장의 빼어난 운전 실력 덕에 9시 전에 둥지로 돌아왔다.
======
댓글목록
해드림출판사님의 댓글
해드림출판사 작성일
11월만 해도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었는데'
12월이 되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좋은 날 오면 뵙겠습니다.
임영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