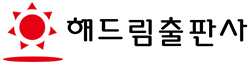수필 그리운 아버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언홍 댓글 1건 조회 724회 작성일 21-12-18 10:01본문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서는 산. 하늘도 산도 가을이 깊다 . 추수가 끝난 텅빈 들녁엔 제 살을 털어낸 누런 볏단이 가을볕에 한가로이 졸고있다. 푸른빛을 다 털어버리지 못한 대추나무 이파리들이 가을 바람에 푸르르 푸르르 날린다. 어디선가 까투리가 울고있다. 계절 탓인가 울음소리가 아프다.
창턱에 팔을 고이고 무심히 앉아있는 내 팔을 아이가 잡아끈다. 밤을 삶아달라고 조른다. 올 여름 태풍이 심하게 불어 과수농장들이 울상을 짓는다는데 신통하게도 우리 집 밤나무는 어느 해보다 많이 열렸다. 아이 성화에 서둘러 밤을 삶아 그릇에 담아 아이와 마주앉으니 문득 먼 산에 홀로 누워계신 아버지가 떠오른다. 밤을 무던히도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
밤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불효한 자식이었나를 돌아보게 된다. 아버지가 평생을 끌어안고 사셨던 지병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던 당신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자식으로서, 딸로서 한 번도 알려 하거나 헤아려보지 않았고 무관심했었다. 손 붙들고 병원 문 한번 두드려 보았던가, 난 그저 나 사는것만 급급해서 동생들한테 모든걸 미뤄 놓고 나몰라라했엇다. 그 아버지가 간경화로 쓰러지셔서 병원을 찾았을 때야 비로서 내가 얼마나 무심한 딸이었나를 후회했다. 내가 한 일은 고작, 당신 사후에 수필집 한 권 들고 찾아가 무덤 앞에 엎드려 흐느낀 것이 다였다. 그날 따스하게 내리쬐던 가을볕이 너무 좋아 무덤 위의 잔디마저도 아버지 손길같던 그 느낌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것 같다.
지병 탓에 평생 하루 두끼로 연명하셨던 내 아버지는 유독 밤을 좋아하셨다. 먹던 밤소쿠리를 감췄다가 다시 꺼내 잡수실 정도로 좋아하셨다. 손아래 여동생은 햇밤이 나오기 무섭게 밤을 말로 사들고 아버지를 찾아가곤했다. 그 밤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흐뭇해 하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동생이 부럽다 못해 밉기까지 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동생이 대신 해 주니 고맙기도 하련만 왠지 아버지 사랑이 모두 동생한테 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
사는 형편도 그러했지만, 시집살이하는 처지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처지라고, 이런저런 핑곗거릴 만들며 나 몰라라 했던 딸이 나였다. 이 못난 딸이 이제는 밤나무까지 심어 놓고 살 건만 한 번 떠나신 아버지는 돌아오시지를 않는다. 효도를 하려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던 옛어른들의 말씀이 이즘와 뼈에 사무치는건 아마도 나도 나이들어감이 아니겠는가..
아버지가 지금도 어디선가 이 딸을 지켜보고 계실건만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딸은 무심히 밤 껍질을 벗기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
댓글목록
한판암님의 댓글
한판암 작성일아버님이 좋아 하셨던 밤을 기옥하고 계시네요. 저는 외아들임에도 저의 선친이 생전에 무엇을 즐기거나 좋아 하거나 즐기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답니다. 어렴풋이 기억 나는 것은 술잔을 기울이시던 모습만 아련할 뿐....... 물론 어머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엉터리 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엔 불쩍 그 분들이 보고파 생각에 잠기곤 하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날 보람되시고 희망의 임인년 맞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