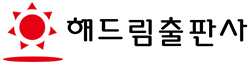수필 가시고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언홍 댓글 2건 조회 786회 작성일 22-01-01 10:50본문
시골로 이사오기 훨씬 전의 일이다.
여주 사는 시누이 집을 찾아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강을 끼고 도는 한적한 도로변에 강물이 넘쳐흘러 들어와 넘실거리는 논 다랑이가 눈에 띄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논 우렁이가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졸라 차를 세우고 논둑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가 보았다. 삼월이라 아직 물이 차가울 때였건만 고여있는 논물이라서인지 따뜻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렁이가 눈에 뜨이지를 않았다.
나뭇가지를 찾아다 살살 바닥을 헤쳐 보니 그제야 까만 갑옷을 걸친 논우렁이가 물속에 엎드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어머, 어머 있어!."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렁이는 꽤 많았다. 흙물이 뽀얗게 일어나는 논바닥을 얼마나 헤집고 다녔는지. 바짓가랑이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정강이가 축축해 질 때쯤 해서야 논둑으로 올라섰다.
준비도 없었던 탓에, 물이 뚝뚝 흐르는 우렁이를 신문지에 싸들고 어둑해지는 길을 얼마나 희희낙락하며 돌아왔던지. 집으로 돌아와 우렁이를 해감 시킨 뒤 된장을 넣고 삶아 건져 아이들과 둘러앉았다. 헌데 단단한 껍질 속에 틀어박힌 우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밑동을 자르면 잘 빠지려나 싶어 칼끝으로 툭 치니 무언가 새카만 것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많은 새끼우렁이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어미 살은 이미 다 파여 겉 딱지만 붙어있어 결국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으니 희희낙락 돌아오던 내 모습이 얼마나 미안해 지던지.
며칠 전 가시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동물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를 생각했다.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않고 오직 새끼가 부화할 날만 기다리며 온 정성을 다 쏟다가 결국엔 기진하여 죽어가는 아비 가시고기. 그 쓰러진 아비를 뜯어먹으며 새끼들은 부족한 영양을 섭취한다고 한다. 제 몸마저도 자식을 위하여 내어주고 떠나는 가시고기.
내 나이 삼십 초반에 이웃집에 영선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충청도가 고향인 그녀는 집을 떠나와 작은아버지 집에 기거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밥상에 놓인 계란 프라이만 보아도 엄마가 생각난다며 울먹였다. 어쩌다 고향에 내려오는 딸을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특식이 계란프라이였단다. 딸이지만 맏이인 그녀를 도회지로 유학 보낸 건 순전히 엄마의 뜻이었다고 한다.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도시로 등 떠민 엄마 덕분에 도회지 물도 먹어 볼 수 있었던 동네 유일한 여자 유학생이었단다.
어느 해 겨울. 학창시절의 마지막 방학을 보내려고 고향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밤이 이슥하도록 책을 보고 있으려니 엄마가 들어와 잠자리를 펴주고 나갔다고 한다.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책을 보다가 어느 틈에 잠이 들었던 것일까. 숨이 막힐 듯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떠보니 방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탁탁 불 튀는 소리에 바느질 하던 엄마가 놀라 달려와 딸을 감싸 안아 밖으로 밀쳐 내었다. 딸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지만, 엄마의 나일론 옷에 달라붙은 불길은 온 몸을 핥으며 미친 듯이 타올랐다. 논도 개울도 얼어붙은 한 겨울이었다. 들판을 미친 듯 내달리던엄마는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며 너울너울 춤을 추다 쓰러져갔다.
촛불을 켜둔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잠이든 그녀가 몸을 뒤채이는 바람에 촛불이 이불에 옮겨붙어 일어난 참화였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바깥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얼어붙은 들판을 한 마리 불새처럼 불덩어리가 되어 미친 듯 내달리던 엄마의 모습이 한동안 논밭으로 맴돌던 때문이었다.
기억 속에선 늘 춤을 춘다던 어머니. 새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불꽃같이 보이기도 한다며 울먹이던 그녀도 이 세상 모든 가시고기 어버이처럼 지금은 어디선가 아이 엄마가 되어 살고 있으리라.
댓글목록
한판암님의 댓글
한판암 작성일
가시고기의 사랑이나 자기의 껍질 속에 새끼를 부화하고 죽어간 우렁이나
자식을 불 속에서 구하고 자신은 불길을 피하지 못한 어머니나
모두 숭고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네요.
임인년이 밝아왔습니다.
올해엔 더욱 보람되고 행복하세요.
장은초님의 댓글
장은초 작성일
언홍샘 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활발히 글을 쓰시는 언홍샘과 교수님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글 많이 쓰십시오.
문득문득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2005년 문학저널 시절, 창작란에 서로 뒤질세라 앞다투어 글을 올리고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주던 그때 참 좋았었지요. 꿈도 있고 행복도 있었고요.
언홍샘 글 부지런히 쓰세요. 제가 댓글은 꼭 달아드릴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