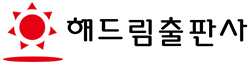빈물병과 감자/김명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빈물병과 감자
김명희
모자를 먹은 보아 뱀처럼 생긴 제주 성산 일출봉은 미인의 콧대처럼 아름답기는 하지만 절대 만만치 않다. 경사도가 높아 턱까지 차오르는 숨도 가라앉혀 줄 만큼 기막힌 절경이 아니었다면 결코 견디지 못했을 터다.
헉헉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흔들거리며 오르는 것이 있으니, 열기를 식히고 목마름을 달래주는 생수병이다. 나 역시 찬 얼음 물병을 들고 가며, 물 한 모금 마시고 숨 고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다 한 번 보며 일출봉을 향해 올랐다. 오르면 오를수록 넉넉한 품을 보이는 제주의 바다를 보며 숨 쉬듯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거의 정상에 다다르는 계단 난간에 빈 생수병이 오도카니 서 있다. 바람이 불거나 톡 치기만 해도 저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다. 누군가 물이 들어있는 동안 꽉 움켜쥐고 데려왔다가, 빈병만 저리 버리고 간 것이리.
조금 전, 한 떼의 학생들이 올라왔다. 목이 마른 듯 “물 좀 주세요!” 사정한다. 들고 있던 물을 건네주었더니, “아주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하게 웃는다. 생전 처음 본 아줌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필요했던 그 물이 저 병에도 들어있었겠지.
왜일까, 그 빈 물병을 보면서 컴컴한 상자 속에서 다 쪼그라진 몸으로 새끼를 매달고 있던 감자가 떠오른 것은.
다용도실 정리를 하다 깜짝 놀랐다. 쪼글쪼글 다 시들어가는 어미 옆에 새끼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어두운 구석에서 감자 한 알이 제 몸은 물기 하나 없이 쭈글쭈글 메말라가면서 어찌 그리도 잘 키워냈는지…….
다 스러져 가는 어미 꼴을 보면서, 있는 힘껏 가져다 탱글탱글 살이 찐 어린 것들이, 저들만 살겠다고 어미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살모사 새끼들처럼 징그러웠다. 미운 마음에 내다버리려다 감자의 정성이 갸륵하여 화단에 묻어주고 물을 주며 잘 자라기를 빌었는데도 싹이 나질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어미감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군가와 많이 닮았다. 다 시들어빠진 어미감자에 붙어있는 탱탱한 어린감자. 바로 우리였다.
말라비틀어진 어미감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 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빈 물병은 우리의 어미요, 아비였다.
일출봉을 내려오는 내내 물병의 하소연을 환청으로 들었다.
“야야. 나도 델꼬 가라. 내 무서버 죽겄다. 난 어찌 가라고. 올라올 때는 지 맴키로 덥석 잡고 가데. 지는 두 발로 힘주고 올라감서도 쉬엄쉬엄 가드만, 내는 흔들흔들, 출렁출렁, 어지럽고, 메스껍고, 심장이 을메나 벌렁거리는지 터지는 줄 알았고만. 성산 봉이 다시 터지는 줄 알았데이, 근데, 야야. 지 볼 일 다 봤다꼬 내를 그 높은 바위에 달랑 올려놓고는 가 버렸데이. 속이 다 비어뿌린 내는 뱃심이 빠져 서 있기도 힘이 들고만. 바람만 쬐께 불어도 흔들거리고 누가 톡 치기만 해도 굴러 떨어질께비 을메나 무서웠는데……. 내는 우찌 내려가라고. 내는 우짜노.”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