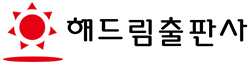백사장의 하루-김소운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백사장의 하루-김소운
눈이 떠지자 창을 여니 아청빛 푸른 하늘이 문득 가을이다. 어제까지의 분망과 노고가 씻은 듯 걷히고 맑고 서늘한 기운이 흉금으로 스며든다. 소제를 마치고 나도 모르게 길에 나서니 오늘은 일요일이다. 등산객들과 소풍가는 남녀들로 근교행 버스는 바쁘다. 복잡을 피하여 사잇길로 빠지니 곧 경춘선로의 교차점이 아닌가. 예정 없이 버스에 올라, 가는 대로 맡기니 버스는 군말없이 달린다. 이윽고 강안을 지난다. 강이 아름다워 차를 스톱시키고 내리니 인적이 고요한 소양강 하류의 이름 모를 백사장, 하루의 유정을 풀기에 가장 좋을 곳인상 싶다.
백사장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청한을 읊조린다. 단풍은 아직 일러 산봉우리는 푸르고 거울같이 맑은 물 위에 떠가는 구름이 가끔 짙은 시름을 던진다. 그러나, 끝없이만 보이는 백사장에는 갈매기 그림자 하나 없고, 10년에 한 번인 듯 느껴지는, 가물거리는 포범이 아쉽게 반갑다. 나는 누워서 문득 생각한다.
천추 일심이요 만리 일정이라고.
고왕금래 수년 만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혈관을 끓어오르게 한다. 사책을 헤치거나, 전설을 뒤지거나 혹은 저기를 보고 혹은 소설을 읽다가도 옳은 것을 위하여 의분을 느끼고 악한 것을 위하여 증오하고 타기하며 사리에 그릇됨을 개탄하고 인생의 과오를 슬퍼함은 너나가 없건만, 매양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개하던 그들이 한 번 현실에 발을 들여놓자 드디어 스스로 증오와 타기의 인간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간이 사는 곳에 비환이 있고, 비환이 있는 곳에 정회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알지 못하는 고도의 이족과도 정은 통할지니 어찌 서로의 애정이 없으며, 저 가물거리는 포범과 같은 반가움이 없으랴마는 어찌하여 서로 적대하고, 시의해야 하며, 심하면 동족도 구수같이 상잔해야 하며, 이웃도 헤치고, 가족도 등지며 배반하고, 모해와 살육이 사상에 그칠 날이 없어야 하는가. 서로가 하루살이 같은 목숨이요, 창해에 뜬 좁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진부한 옛 말을 굳이 되씹어 본다.
와우각상에 쟁하사요, 석화광중에 기차신이란 감상적 애수가 스며드는 것은 최근 나의 과로로 인한 신경의 쇠약에서 오는 것일까.
천추의 느끼는 그 마음은 하나요, 만리에 느끼는 그 정은 하나다. 불가에서 생사를 허무에 돌려, 생야에 일편부운기요, 사야에 일편부운멸이라 했다. 그러나, 한 조각 구름은 떠난 뒤에 남는 것이 없지만 사람은 간 뒤에도 정이 남지 않는가. 고래로 뜬 구름같이 사라진 사람들이야 이제 그 잔해인들 남아 있으랴마는 인류가 존속하는 날까지 면면이 지속해 오는 것은 이 정이다.
불가의 만유귀심이란 그 법심이 무엇인지 모르거니와 심심심이 곧 정이다. 정근을 버리고 미망에서 벗어나 대오귀심을 외치는 대덕에게 심심심이 정이라면 속성의 완미함을 연민해할지 모르나, 나는 원래 그런 묘망한 진리와는 연이 없는 듯하다. 나에게 철학이 있다면 정의 철학이요, 나에게 생활이 있다면 정을 떠나서 따로 없다. 혹 나의 깨닫지 못하는 완미를, 혹 나의 지성 부족한 우둔을 비웃는 이도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아니고는 인생을 맛보며 살 길이 없다.
인간이란 신과 짐승의 사생아라고 한 이가 있다. 그렇다면 정이란 사생아의 개성이다. 신은 이미 정을 초월해 있을 것이요, 짐승을 아직 이 정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지성이니 오성이니 하는 말은 영리한 사생아들의 엉뚱한 어휘다.
성리학자들은 성이니 정이니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한다. 심은 일신의 주재니 성과 정을 통솔하고, 성은 천부의 이니 칠정을 낳는다. 희노애구 애오욕은 기질의 청탁에 따라 때로 선이 되고 때로 악이 되지만 그 본원은 천명의 성이다. 그러므로 그 본질이 선일진대 중화의 덕을 길러 삼재의 하나로서 천지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합리적이요 오묘한 철리엔 둔하다. 또 굳이 형이상학적으로 그 본질을 캐고 체계를 세워 논리를 정리하는 수고를 청부받을 생각도 없다. 무릇 곡소비환이 생활의 표현일진대 이것이 진정이요 인생이 아닌가.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정의 세계를 나는 지금 체감하고 있다. 심이라 해도 좋고 성이라 해도 좋고 정이라 해도 좋다. 나는 적절한 용어를 모른다. 오직 천추일심만리일정, 심즉정이다. 심은 추상적인 존재요, 정은 구체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실로 영속적인 생의 실체요 영속적인 인간의 내용이 아닌가.
흰 구름장이 바람에 불려 강상으로 떠가더니 산봉우리에서 사라진다. 강 속의 그림자도 사라진다. 문득 채근담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풍래소죽에 풍과우 죽불유성이요, 응도한담에 응법우 택불유경'
그렇다. 바람 간 뒤에 소리는 대밭에 남아 있지 않고, 기러기 날아간 뒤에 그림자는 담심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나는 채근담 저자의 낯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눈 위에 기러기 발자취는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떨어지는 꽃잎에서 또 그것을 느껴야 한다. 이 곧 천추일심이요, 만리일정이다.
강안 길로 되돌아 허튼 걸음으로 한식경을 걸었다. 버스가 이삼 차 지나갔을 뿐 고요한 강안의 길이다. 길가에 한 주점이 있다. 막걸리 안주로 도토리묵이 있다. 요기하기에 족했다. 숭굴숭굴하고 부드러운 주모의 씩 웃는 인사가 제법 구수하다. 친절, 불친절 없이 늘 보는 이웃에 대하듯 태연한 인사, 영접을 위해서 마음을 쓸 필요조차 없는 한적한 주점인 까닭이다. 이해의 득실이 없으면 스스로 담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가는 말이 구수하다.
버스가 왔다. 손을 들어 차를 세우고 몸을 실었다. 녹색의 산봉우리들은 석양에 물들어 빛이 더욱 곱고, 강물은 그늘이 져서 검푸르게 흐른다.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