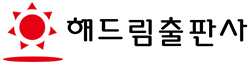거들떠보지 않은 책 꾸러미/임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거들떠보지 않은 책 꾸러미
임 병 식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책을 얼마만큼 읽을까. 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 만큼이나 궁금하고 호기심 가는 일이다. 한데 근자에 나는 단편적이나마 그 실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일부러 알려고 나선 행동은 아니고 넘쳐나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밀려난 책을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마음먹고 책장을 정리했다. 전에도 가끔 해온 일인데, 이사 온 지 한 3년이 넘으니 비좁은 방에 책들이 빼곡해졌다. 그래서 계간 월간지를 포함해 보존가치가 덜한 이백여 권을 골라냈다. 새로 들여놓은 책들을 놓아둘 장소가 없었던 것이다. 우선 대충 정리해 놓고 보니 여백이 생겨서 좋았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음 처리가 문제였다. 막상 책들을 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 책이 나오면 직장에 다닐 때는 차에 싣고 나가 보호시설이나 마을도서관에 기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도 못 되니 막막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갔다. ‘책을 좀 가져왔다.’고 하니, 곁눈질로 보던 관리소 직원의 대답이 매우 심드렁했다. 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핑계였다. 눈에 뻔히 보이는 곳에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 거절이 ‘보관하기 싫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어이가 없었다. 당연히 기분이 상하였다.
오래된 잡지라서 그랬을까. 그렇더라도 성의 있는 대답은 해줘야 할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줘야 할 게 아닌가. 면전박대를 당하고 되돌리는 발길이 무거웠다. 그런 나의 눈에는 조금 전 보았던 책장에 기념패 두어 개만이 달랑 들어있는 모습이 자꾸 어른거렸다.
나는 그 일이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오면가면 보고서 가져갈 수 있도록 책을 몇 권씩 나누어 묶어 재활용 통 옆에 놓아두었다. 한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가며 슬쩍슬쩍 보기는 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거나 헤쳐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책은 결국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디서 정보를 듣고 달려온 고물수집상의 용달차에 실어 떠났다.
나는 그 전경을 지켜보자니 문득 전에 들은 얘기가 스쳤다. 우리나라 굴지의 종로서적이 문을 닫고, 교보문고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순수문예지 코너가 날로 줄어든다는 보도가 생각났다. 아닌 게 아니라 그걸 걸 실감하는 건 굳이 먼 곳의 예를 들것도 없다. 내가 사는 Y시만 해도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수년 사이에 서점이 절반 이상이 간판을 내린 것이다.
서글픈 현실이다. 얼마 전에 지상에 국민 독서량 현황이 발표된 적이 있다. 나는 그걸 보며 어리둥절했다. 여전히 한 달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이 53%라 하면서도, 그 외의 사람들은 책, 그것도 문학 서적을 월 1~2권은 읽고 있다고 모순된 기사가 났던 것이다. 오류라는 인상이 짙었다. 왜냐하면 그 수치는 책을 적게 읽는 사람도 일 년이면 12권의 책을 읽고 있다는 통계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는다면 책이 안 팔일 이유가 없고 서점이 문을 닫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혹시 읽고 있다는 책이 신문이나 주간지 등을 포함시킨 조사는 아닌지, 아니면 불성실한 뻥튀기 답변을 그대로 믿고 쓴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옛사람들이, 독서하는 것을 중히 여긴 예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공자(孔子)님은 역서(易書)를 하도 많이 본 나머지 가죽 끈을 세 번이나 다시 메어 위편삼절(韋編三絶)이란 말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조 때 사람 이덕무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3천여 권의 책을 구해 읽었으며, 역시 조선시대 김득신(金得臣)은 ‘노자’를 2만 번, 사기 ‘백이열전’을 일억 번이나 읽어 그 집을 억만제(億萬齊)라 불렀다고 하지 않던가.
우암 송시열 선생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화상(畵像)에 글을 적기를, ‘고라니와 사슴과 더불어 사는 쑥대로 이은 집에서 창은 밝고 사람은 고요한데 배고픔을 참고 책을 읽노라.’하며 말년의 책 읽은 즐거움을 술회했던 것이다. 그러했던 책 읽기가 천여 세대가 넘게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비록 헌책이지만 단 한 권도 꺼내간 사람이 없다는 건 무어라고 말할까.
어느 소설 작품이 생각난다. 학창시절에 독서를 많이 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소설가가 되고 한 사람은 과수원집 농장주가 되었단다. 소설가가 된 친구는 옛날 책 읽기를 좋아한 농장주 친구를 생각하며 새 책이 나오면 보내주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소설가 친구의 과수원을 찾아가 보니 보내준 책들이 과실 착색을 위해 씌워 놓은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더란다. 그 황망하고 서글픈 심정을 작품에 담아 놓고 있었다.
책을 생각하면서 왜 자꾸만 그런 서글픈 것들이 떠오른 것일까. 책을 읽지 않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한심해서일까, 아니면 빈 책장이 있는데도 거절한 관리소 직원의 태도가 야속해서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시사 내용이나 챙기고 웃고 즐기며 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문학서 같은 건 따분하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모른다. 하나, 살아가면서 그 미디어만 접하면 되는 것일까.
거들떠보지 않은 책이 온종일 있다가 마침내는 재활용 차에 실려 떠나는 정경을 보니 마음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혼신을 다해 글을 썼을 필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얹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2005)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